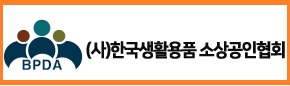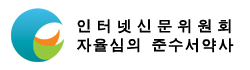|
| ▲ |
지난 9월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만 4,872명으로 전년 1만 3,978명보다 894명(6.4%)이나 늘었다. 최근 10년간 전체 사망자 중 자살 사망자 수를 보면 2014년 1만 3,836명(27.3%), 2015년 1만 3,513명(26.5%), 2016년 1만 3,092명(25.6%), 2017년 1만 2,463명(24.3%), 2018년 1만 3,670명(26.6%), 2019년 1만 3,799명(26.9%), 2020년 1만 3,195명(25.7%), 2021년 1만 3,352명(26.0%), 2022년 1만 2,906명(25.2%), 2023년 1만 3,978명(27.3%), 2024년 1만 4,872명(29.1%)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사망자 수는 35만 8,569명으로 전년보다 6,058명(1.7%) 증가한 수준이다. 하루 평균 982.4명이 숨진 셈이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은 702.6명으로 같은 기간 13.3명(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인 자살 사망률은 29.1명이었다. 한해 전보다 6.6%(1.8명) 증가한 데다 금융 위기 이후인 2011년(31.7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자살 사망자 수와 사망률 모두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로 OECD 평균(10.8명)의 2.4배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조금씩 떨어지는 듯싶다가 2022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03년 이후로 단 한 번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떨쳐버린 적이 없어 충격을 더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10~30대는 물론이고, 40대 사망원인 1위도 자살이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전년도 대비 2024년도 연령대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증가는 10대(8.0명 증가 │ 1.4%↑), 20대(22.5명 증가 │ 1.6%↑), 30대(30.4명 증가 │ 14.9%↑), 40대(36.2명 증가 │ 26.0%↑), 50대(36.5명 증가 │ 12.2%↑), 60대(31.9명 │ 3.9%↑)도 증가했다. 반면 70대(35.6명 감소 8.7%↓)와 80세 이상(53.3명 감소 │ 10.3%↓)은 하락했다. 60대 이하 전 연령층에 걸쳐서 자살률이 오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경제 활동과 가족 부양 부담이 집중되는 30~40대에서 자살이 급증한 것은 사회 안전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1983년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비중이었던 암(악성 신생물)을 제친 것이다. 지난해 40대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가 36.2명인데 전년(2023년 31.6명)보다 크게 뛰었다. 암의 경우엔 같은 기간 34.9명에서 34.2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40대 사망자 1만 836명 중 자살한 사람은 2,817명으로 26%를 차지했다. 이는 40대 사망원인 1위로, 2위인 암 사망자 2,659명(24.5%)보다 158명이나 많았다. 이제까지 40대 사망원인 1위는 줄곧 암이었고, 자살은 2005~2023년 19년 연속 2위였다. 전체 사망원인 1위는 여전히 암이다. 전체 사망자 4명 중 1명(24.8%)이 암으로 사망했다. 인구 10만 명당 암 사망률은 174.3명으로 전년보다 7.5명(4.5%) 상승했다. 심장질환(9.4%), 폐렴(8.4%), 뇌혈관질환(6.9%), 자살(4.1%)이 그 뒤를 이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폐렴, 알츠하이머병, 고혈압성 질환의 순위가 상승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은 3.4%로 6위를 차지하면서 전년보다 5계단 상승했다. 이와 같은 40대 자살률 증가에 대해선 실직이나 채무 등 경제적 압박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이어졌다. 보건당국은 대형 사건 발생 뒤 2~3년의 시차를 두고 자살률이 증가하는 전례에 비추어 보면, 코로나19가 미친 사회·경제적 여파에 따른 것일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자살 사망의 특성상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좀 더 정교한 실태 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 개선되기는커녕 갈수록 악화일로(惡化一路)로 치닫는 자살률 지표를 두고, 전문가들은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자살 사망자가 증가하는 것은 ‘모방 자살 효과(Copycat suicide effect)’라고도 하는 ‘베르테르 효과(Werther effect │ 유명인 자살 모방)’에 의한 것도 있지만 실직과 생활고, 채무 등 구조적 위기 요인이 늘어난 영향이 클 것이다. 최근 정부는 10년 안에 자살률을 40%가량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어 자살 문제를 거론하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9월 12일‘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확정했다. 목표는 2024년 28.3명인 자살률(인구 10만 명당)을 2034년까지 17명 이하로 40%가량 낮추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이는 자살률 17.1명으로 OECD 2위 리투아니아를 제치겠다는 의미다. 시늉에만 그쳐선 안 된다. 우리나라는 중증 우울증 환자의 겨우 10% 정도만이 치료받고 있다고 한다. OECD 회원국들에서 50~60%가 치료를 받는 것과 차이가 크다. 자살 고위험군이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살 예방에 나서고 이를 위한 과감한 예산 투자도 병행돼야만 한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만연한 과잉 경쟁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로를 바꾸지 않으면 자살 사망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돌이키기는 사실상 어렵다. 경제의 핵심인 40대의 자살률 급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서둘러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실직·이혼 등 경제·정신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국가역량을 총력 집주(集注)해야만 한다.
[저작권자ⓒ 강원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